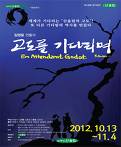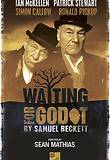# 69년 베케트는 ‘고도…’로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바로 그 해 12월 ‘고도…’의 한국 초연이 있었다. 연출자는 33세의 임영웅이었다. 그 후 40년 동안 임영웅은 27번에 걸쳐 ‘고도…’를 연출했다. 물론 그때마다 달랐다. 그리고 지난 8일부터 28번째 ‘고도…’를 다시 무대에 올렸다. 대단한 집념과 열정이다. 그 사이 33세의 혈기 넘치는 검은 머리는 73세의 은근한 백발로 변했다. 하지만 그의 무대는 결코 늙지도 안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해를 거듭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웠다.
# 하나의 연극을 40년 동안 28번이나 새롭게 무대 위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투혼이다. 거기엔 삶의 의식 같은 연극을 서른 번 가깝게 다시 고쳐 선보인 노 연출가의 열정과 집념, 그리고 기다림과 숙성의 위력이 담겨 있다. 뭐든 단번에 해치우려 하고 당장에 결판내지 못해 안달하는 요즘 세태에 역행하는 임영웅의 ‘고도…’엔 기다림과 숙성의 묘한 맛을 우려 낸 진정한 예술 거장의 숨결이 진하게 배어 있다.
# 연극 ‘고도…’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늙은 방랑자가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기다림으로 끝난다. 그들에게 삶이란 곧 그 기다림이며,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 따른 초조함과 낭패감을 떨치기 위해 그들은 끝없이 지껄이고, 장난치며, 논다. 그들에게 기다림은 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본능적인 삶의 방식이다. 기다림은 절망을 이기는 방법이고 희망을 품는 자세다.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기약한다.
# 극이 끝나도록 기다리던 고도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결코 놓아버릴 수 없는 기다림을 향한 절박함이 텅 빈 무대를 후려치듯 끝나는 것이 연극 ‘고도…’의 묘한 맛이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본 사람은 안다. 그 기다림이 사랑임을. 배고파 본 사람은 안다. 한 덩어리의 빵을 간절히 기다림이 곧 생명임을. 신의 응답을 구하며 기다려 본 사람은 안다. 그 기다림이 신앙임을. 갇혀 본 사람은 안다. 풀려날 날에 대한 기다림이 자유임을. 결국 기다림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다. 나아가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곧 그 사람의 미래다.
# 기다려야 숙성될 수 있고 기다려야 얻을 수 있다.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삶의 놀라운 지혜요, 힘이다. 철없는 자식이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릴 줄 아는 부모만이 철든 자식을 얻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할 바를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세상을 얻는다. 하지만 신호등의 불빛이 바뀌는 것조차 기다리지 못해 경적을 울리며 안달하는 우리에게 기다릴 줄 아는 것의 힘과 미덕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제 그것을 회복해야 할 때다.
# 기다림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다. 기다림은 막연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미 닭이 달걀을 품듯이 꿈·희망·미래를 품어 부화시키는 또 다른 의미의 적극적인 행위다. 연출가 임영웅이 40년 동안 ‘고도…’라는 하나의 작품을 품고 또 품어 위대한 삶의 작품을 새롭게 부화시켜 냈듯이 이제 우리도 나만의 ‘고도…’를 품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정진홍 논설위원
,,,,,,,,,,,,,,,,,,,,,,,,,,,,,,,,,,,,,,,,,,,,,,,,,,,,,,,,,,,,
고도를 기다리며  ‘대체 고도는 누구인가.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가. 이것은 비극인가 희극인가. 외마디 말로 주고받는 난삽한 대화, 대체 이것은 연극이기라도 한 것인가.’ 이어령 전 교수는 의문문으로 이어지는 평을 내기도 했다. 베케트는 “이 작품에서 신을 찾지 말라. 보는 동안 즐겁게 웃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초연 당시 연출자가 “고도는 누구인가”라고 묻자, 베케트는 “내가 그걸 알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라며 설명을 피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난해한 부조리극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이가 연출가 임영웅이다. 그는 연극과 함께 외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위기의 여자> <딸에게 보내는 편지> 등 100여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1966년 국내 최초의 창작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에 가수 패티김을 출연시키는 등 파격적 연출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인물이다. <살짜기 옵서예>가 초연된 10월26일이 ‘뮤지컬의 날’로 정해진 것도 그의 작품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연극인생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작품을 고른다면 <고도를 기다리며>일 것이다. 1969년 이 연극을 선보인 이후 20번이나 연출을 맡았고, 한국 극단으로는 처음 아비뇽 페스티벌에 참가해 세계 연극계의 주목을 받았다. 임영웅 연출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초연된 지 40년을 맞았다. 그동안 1114회의 무대가 꾸며졌고 누적 관객만 2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초연의 김성옥·함현진·김무생·김인태 등을 비롯, 전무송·주호성·조명남·김진동 등 기라성 같은 국내 배우들이 이 연극을 거쳐갔다. 한 연출가가 같은 작품을 40년간 재해석하며 무대에 올린 것은 연극사에 남을 일이다. “다른 활동을 접더라도 끝까지 하고 싶은 작품”이라는 노 연출가의 말 속에서 한 연극인의 집념과 예술혼을 읽는다. <박성수 논설위원> ,,,,,,,,,,,,,,,,,,,,,,,,,,,,,,,,,,,,,,,,,,,,,,,,,,,,,,
영화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Godot, 20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