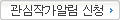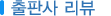두보 시 300수
양장
|
|||||||||||||||||||||


『두보시300수』는 중국 당나라 때의 위대한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시를, 평생을 중국문학 연구에 종사한 노학자와 소장학자가 함께 우리말로 옮긴 번역본이다. 두보의 시를 시기별로 나누어 그 시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시들을 꼼꼼한 주석과 함께 번역했다. 그리고 부록으로 두보 연보, 역대 명가들의 두시총평(杜詩總評), 두보의 시를 제재로 한 유명한 화가들의 두보시의도(杜甫詩意圖)를 실어놓았다. 또한 원문에는 한글 음을 함께 붙여서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의 편의를 도왔다.
두보전(杜甫傳)
두보 관계 지도
용문산 봉선사를 유람하다(遊龍門奉先寺)
태산을 바라보다(望嶽)
연주의 성루에 올라(登?州城樓)
원외랑 송지문의 옛 별장에 들르다(過宋員外之問舊莊)
용문산(龍門)
정씨의 동쪽 정자(重題鄭氏東亭)
이백에게(贈李白)
항상 술에 취한 여덟 명의 선인(飮中八仙歌)
병거행(兵車行)
가난할 때 사귄 친구(貧交行)
안서로 가는 위서기를 전송하다(送韋書記赴安西)
곡강(曲江)
여인행(麗人行)
구일 곡강에서(九日曲江)
영가 현위가 된 배이규를 전송하다(送裵二?尉永嘉)
종손 제에게 보이다(示從孫濟)
뜰 앞 감국을 탄식하다(歎庭前甘菊花)
정광문에게 희롱 삼아 증여하고 아울러 소사업에게 올리다(戱贈鄭廣文虔兼呈蘇司業)
백수 명부의 외삼촌댁에서 비를 기뻐하다가 ‘過’ 자를 얻다(白水明府舅宅喜雨得過字)
서울에서 봉선현으로 가서 읊은 오백 자의 감회(自京赴奉先詠懷五百字)
피난하다(避地)
왕손을 슬퍼하다(哀王孫)
...
부록
시성(詩聖) 두보의 시와 인생
두보 연보
역대 명가들의 두시총평(杜詩總評)
두보시의도(杜甫詩意圖)
제목 찾기
두보는 중국 하남성(河南省) 공현(鞏縣) 출신으로, 자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이다. 그의 먼 조상은 진(晉)나라 때의 학자 두예(杜預)이고, 조부는 당나라 초기에 이름을 떨쳤던 시인 두심언(杜審言)이다. 이러한 가풍의 영향으로 두보는 어린 시절부터 시를 잘 지었으나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하고, 각지를 유랑하며 이백(李白)ㆍ고적(高適) 등과 교유하기도 하였다. 그 뒤로도 두보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안녹산의 난을 비롯한 잦은 전란으로 인해 유랑의 삶을 계속해야 했다.
그는 오랜 유랑 생활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평생토록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러나 끝내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동정호(洞庭湖) 인근의 배 안에서 병을 얻어 객사하고 만다. 두보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향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다 할 수 있다. 그의 시는 바로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두보는 동시대의 시인 이백과 함께 '이두(李杜)'로 일컬어지는 중국 최고의 시인이다. 두보의 시는 이전의 시풍(詩風)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와 아울러 후대의 시인들에게는 한시(漢詩)의 전범이 되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그를 '시성(詩聖)'이라 한다. 또한 두보의 장편 고시(古詩)는 사회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서, '시사(詩史 : 시로 표현된 역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두보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당나라 때의 한유(韓愈)가 "이백ㆍ두보의 문장이 있는 곳에, 그 불꽃은 만 길이나 빛나리" 하며 찬양한 이래로, 송나라로 접어들어 왕안석(王安石)?소식(蘇軾) 등에게 칭송됨으로써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두보는 슬픔과 기쁨(悲歡), 막힘과 통함(窮泰), 밖으로 발함과 안으로 거두어들임(發斂), 아래로 내리누름과 위로 올라감(抑揚), 빠름과 느림(疾徐), 종횡(縱橫) 등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평담(平淡)하고 간이(簡易)한 것이 있고, 화려하고 정확한 것이 있고, 삼군(三軍)의 장수 같은 엄함과 위엄이 있고, 천리마같이 치달림이 있고, 산골짜기 은사 같은 담백하고 정간(精簡)함이 있고, 고귀한 공자(公子) 같은 풍류가 있다. 두보의 시는 들어가는 실마리가 치밀하고 사상 감정이 깊기 때문에, 보는 자가 그 속내까지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 묘처를 알기가 쉽지 아니하니, 견문이 얕은 자가 어찌 쉬이 두보의 시를 엿볼 수 있으리오? 이것이 바로...두보는 중국 하남성(河南省) 공현(鞏縣) 출신으로, 자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이다. 그의 먼 조상은 진(晉)나라 때의 학자 두예(杜預)이고, 조부는 당나라 초기에 이름을 떨쳤던 시인 두심언(杜審言)이다. 이러한 가풍의 영향으로 두보는 어린 시절부터 시를 잘 지었으나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하고, 각지를 유랑하며 이백(李白)ㆍ고적(高適) 등과 교유하기도 하였다. 그 뒤로도 두보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안녹산의 난을 비롯한 잦은 전란으로 인해 유랑의 삶을 계속해야 했다.
그는 오랜 유랑 생활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평생토록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러나 끝내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동정호(洞庭湖) 인근의 배 안에서 병을 얻어 객사하고 만다. 두보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향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다 할 수 있다. 그의 시는 바로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두보는 동시대의 시인 이백과 함께 '이두(李杜)'로 일컬어지는 중국 최고의 시인이다. 두보의 시는 이전의 시풍(詩風)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와 아울러 후대의 시인들에게는 한시(漢詩)의 전범이 되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그를 '시성(詩聖)'이라 한다. 또한 두보의 장편 고시(古詩)는 사회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서, '시사(詩史 : 시로 표현된 역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두보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당나라 때의 한유(韓愈)가 "이백ㆍ두보의 문장이 있는 곳에, 그 불꽃은 만 길이나 빛나리" 하며 찬양한 이래로, 송나라로 접어들어 왕안석(王安石)?소식(蘇軾) 등에게 칭송됨으로써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두보는 슬픔과 기쁨(悲歡), 막힘과 통함(窮泰), 밖으로 발함과 안으로 거두어들임(發斂), 아래로 내리누름과 위로 올라감(抑揚), 빠름과 느림(疾徐), 종횡(縱橫) 등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평담(平淡)하고 간이(簡易)한 것이 있고, 화려하고 정확한 것이 있고, 삼군(三軍)의 장수 같은 엄함과 위엄이 있고, 천리마같이 치달림이 있고, 산골짜기 은사 같은 담백하고 정간(精簡)함이 있고, 고귀한 공자(公子) 같은 풍류가 있다. 두보의 시는 들어가는 실마리가 치밀하고 사상 감정이 깊기 때문에, 보는 자가 그 속내까지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 묘처를 알기가 쉽지 아니하니, 견문이 얕은 자가 어찌 쉬이 두보의 시를 엿볼 수 있으리오? 이것이 바로 두보가 전무후무한 위대한 시인이 되는 까닭이다."(왕안석)
"두보의 시, 한유의 문장, 노공(魯公, 顔眞卿)의 서예는 모두 각 분야의 집대성한 것들이다. 시를 배울 때는 마땅히 두보를 스승으로 삼아야 하는데, 규칙과 법도가 있기 때문에 배울 만하다. 한유는 시에 대해서는 본래 이해함이 없었지만, 재주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빼어났을 따름이다. 도연명은 시를 지은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취향을 써내었을 뿐이다. 두보의 시를 배우면, 설령 완벽하게 배우지 못하더라도, 썩 괜찮은 좋은 시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한유의 재주와 도연명의 묘함이 없이 그들의 시를 배운다면, 결국에는 백거이(白居易)가 될 뿐이다."(소식)
두보의 시는 우리나라의 시인들에게도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 두보의 시를 모르고서는 시인으로서 학자로서 행세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다산 정약용(丁若鏞)은 두보의 시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바 있다.
"시는 마땅히 두보를 공자(孔子)로 삼아야 한다. 그의 시가 백가의 으뜸이 되는 것은 『시경』 3백 편을 이었기 때문이다. 『시경』 3백 편은 모두 충신, 효자, 열부, 양우(良友)들의 진실하고 충후한 마음의 발로이다. 두보의 시는 고사를 인용함에 있어 흔적이 없어서 언뜻 보면 자작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출처가 있다. 바로 두보가 시성(詩聖)이 되는 까닭이다."
또한 한글이 창제된 뒤에는 왕명으로 두보의 시 전체가 번역되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두시언해(杜詩諺解)』(원제는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이다. 『두시언해』는 세종 25년(1443)에 착수하여 38년 만인 성종 12년(1481)에 간행하였는데, 이는 국가사업으로는 처음으로 번역한 개인의 시집이다. 유학(儒學)을 국시로 채택한 조선에서 사서삼경(四書三經)보다 오히려 먼저 번역한 셈이니, 두보의 시가 그 당시 얼마나 높이 평가되었는지 알게 해주는 자료라 하겠다. 

'http:··blog.daum.net·k2gim·' 카테고리의 다른 글
| 这45种文房器玩,你能叫得出名字的有多少? (0) | 2015.07.13 |
|---|---|
| 中國各朝代滅亡原因 (0) | 2015.07.13 |
| 두보의 시,역경 속의 고귀한 삶의 자세,이지운(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0) | 2015.07.12 |
| 中华书局版《历代史料笔记丛刊》全目 (0) | 2015.07.05 |
| 광개토태황능비(廣開土太皇陵碑) 해설 (0) | 201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