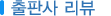시가로서의 문학성과 음악으로서의 실용성을 고루 갖춘,
중국 시가 문학의 황금기를 수놓은 송사(宋詞)의 정수.
『송사삼백수』는 청대(淸代)의 사학자(詞學者) 주조모가 송대의 대표적인 사작가의 작품을 골라 모은 사선집이다. 사는 악곡에 맞춰 지은 시가로, 노래의 가사 부분을 지칭하는 이름이며, 책은 송나라 때의 가요라 할 수 있는 송사의 다양한 작품과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 이 책에는 송사의 대표적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기타 송대의 사단에서 활약한 작가들의 작품도 수록되어 있어, 송사의 전반적인 풍격과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송사는 크게 남녀의 염정을 위주로 부드럽고 아름답게 노래한 완약(婉約) 풍격과, 다양한 제재를 음률에 얽매이지 않고 웅대하게 풀어낸 호방(豪放) 풍격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이는 작가의 개성이나 작품의 내용과 형식 등에 따라 더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사는 윤리 예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기에 보다 풍부하고 진솔한 감정들을 담아내는데, 이 책에서는 사대부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랑 받았던 '자유로운 노래' 사를 친절한 주석과 해설을 곁들여 더 가까이 만나볼 수 있다.
술자리에서 그녀의 맑은 눈길은 그윽하고
거문고 옥주는 비스듬히 날아가는 기러기 같아라
애끊는 곡조를 탈 때는
봄 산 같은 아미를 숙이누나 --- p.29, 「보살만」 중에서
수심은 그지없어라
거듭 옛일을 생각하느니
규방 깊은 곳
몇 번이나 음주가무가 끝난 후
향기롭고 따뜻한 원앙금침을 함께했던고
어찌 잠시라도 헤어져
그녀를 걱정하게 했으랴
운우의 정을 맘껏 즐겼고
천만 가지 깊은 정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했었네 --- p.76, 「낭도사만」 중에서
십 년 동안 삶과 죽음으로 나뉘어 아득하여라
생각 않으려 해도
참으로 잊기 어려워라
천 리 먼 외로운 무덤
이내 처량한 심정 말할 데 없어라
설사 서로 만난들 알아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은 먼지로 찌들었고
머리는 서리 내려 세었어라 --- p.146, 「강성자」 중에서
해마다
제비가
먼 곳을 떠돌다가
돌아와 서까래에 깃들인 것 같구나
몸 밖의 일은 잠시 생각 말고
술잔을 늘 가까이해야 하리로다
초췌한 강남의 지친 나그네는
왁자하고 흥겨운 노랫가락을 차마 들을 수 없구나
노래하는 잔치 자리 가에
먼저 베개와 대자리를 펴놓아라
취하거든 드러누울 터이니 --- p.216...술자리에서 그녀의 맑은 눈길은 그윽하고
거문고 옥주는 비스듬히 날아가는 기러기 같아라
애끊는 곡조를 탈 때는
봄 산 같은 아미를 숙이누나 --- p.29, 「보살만」 중에서
수심은 그지없어라
거듭 옛일을 생각하느니
규방 깊은 곳
몇 번이나 음주가무가 끝난 후
향기롭고 따뜻한 원앙금침을 함께했던고
어찌 잠시라도 헤어져
그녀를 걱정하게 했으랴
운우의 정을 맘껏 즐겼고
천만 가지 깊은 정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했었네 --- p.76, 「낭도사만」 중에서
십 년 동안 삶과 죽음으로 나뉘어 아득하여라
생각 않으려 해도
참으로 잊기 어려워라
천 리 먼 외로운 무덤
이내 처량한 심정 말할 데 없어라
설사 서로 만난들 알아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은 먼지로 찌들었고
머리는 서리 내려 세었어라 --- p.146, 「강성자」 중에서
해마다
제비가
먼 곳을 떠돌다가
돌아와 서까래에 깃들인 것 같구나
몸 밖의 일은 잠시 생각 말고
술잔을 늘 가까이해야 하리로다
초췌한 강남의 지친 나그네는
왁자하고 흥겨운 노랫가락을 차마 들을 수 없구나
노래하는 잔치 자리 가에
먼저 베개와 대자리를 펴놓아라
취하거든 드러누울 터이니 --- p.216, 「만정방」 중에서
정강의 치욕을
아직 씻지 못했으니
이 신하의 한은 어느 때에나 없어질꼬
병거를 몰고 달려가서 깨부수리라
하란산의 관문을
장쾌히 오랑캐의 살로 주린 배를 채우고
담소하면서 흉노의 피로 마른 목을 축이리라
옛 산하를 모두 되찾은 후에
천자를 배알하리로다 --- p.331, 「만강홍」 중에서
날이 저무는데
높은 성을 바라보나 보이지 않고
어지러이 무수한 산만 보이네
내가 떠나간들
그녀가 당부한 말을 어찌 잊으랴
'제발 일찍 돌아오소서
붉은 꽃을 봐줄 이 없을까 두려워요'
병주의 좋은 가위도 헛되나니
천만 가닥 이별의 수심을 자를 수 없어라 --- p.428, 「장정원만」 중에서
그녀의 정겨운 마음씨와 고운 눈길이
늦봄 술자리에서 상사의 정을 일으키게 했었다네
그녀 어찌 알랴, 이 몸은 그리움 때문에 여위어
옛 옷을 다시 마름질해야 하는 것을 --- p.567, 「서학선」 중에서
둥글고 푸른 연잎은 본디 깨끗한데
먼 물가의 얕은 모래톱 가에 있으니
우뚝 서 있는 모습이 그지없이 말고 고와라
돌돌 말린 연잎은 미녀가 떨어뜨린 비녀인 듯
가을의 마음을 펼쳐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많은 여름 더위를 말아 넣고 있을 수 있으랴
원앙은 연잎 밑에서 밀어를 나누는데
빨래하는 아가씨에게는 말하지 마라
아가씨의 원망의 노래가 갑자기 꽃바람을 멈추게 하면
구름 같은 푸른 연잎이 시들까 두렵구나 
 --- pp.640-641, 「소영」 중에서
--- pp.640-641, 「소영」 중에서
시(詩)는 장엄하나 사(詞)는 아름답다!
누구나 즐기는 만인의 노래
중국 시가 문학의 황금기를 수놓은 송사(宋詞)의 정수
"비단 자리와 자수 휘장 안에는 귀공자들과 미녀들이 있어,
귀공자는 고운 종이를 돌려가며 아름다운 사를 짓고,
미녀들은 섬섬옥수를 들어 거문고를 타며 노래하니,
맑고 아름다운 사는 미녀의 요염한 자태를 돋보이게 한다."
당시와 함께 중국 시가 문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송사를 모아 엮은 『송사삼백수(宋詞三百首)』가 문학과지성사 대산세계문학총서 102번째 권으로 출간되었다. 사는 악곡에 맞춰 지은 시가로, 노래의 가사 부분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송사는 위로는 사대부로부터 아래는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애호를 받으며 유행했다. 사는 시가로써의 문학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음악으로서의 실용성도 가지고 있어서, 사대부와 일반 서민의 연회 석상에서 불리었다. "북송에서 사가 유행할 때에는 우물 있는 곳이면 모두 유영(柳永)의 사를 노래했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사는 신분과 상관없이 예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으로 즐겨 불렀던 가요였다.
『송사삼백수』는 청대(淸代)의 사학자(詞學者) 주조모가 송대의 대표적인 사작가의 작품을 골라 모은 사선집이다. 서명을 ‘송사삼백수’라고 한 것은 주조모가 선정한 작품 수가 300수였기 때문이지만, 이보다 앞서 청 견륭(乾隆) 때에 손수(孫洙)가 편집한 『당시삼백수(唐詩三百首)』가 있었고, 『시경(詩經)』을 ‘시삼백(詩三百)’이라고 부르는 데서 연유한 명칭이기도 하다.
『송사삼백수』의 초간본은 1924년에 간행되었는데, 수록된 작품 수는 서명과 같은 300수이고, 부록으로 13수가 더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후에 주조모는 내용과 형식이 완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작품을 빼고 283수만을 선정하여 중편본(重編本)을 내었다.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30여년 동안 학생을 가르친 이동향 명예교수가 증편본에 실린 283수를 옮기고 주석 및 해석을 덧붙였다. 주조모는 『송사삼백수』를 편찬할 때, 예술적 형식과 사상 내용을 모두 중시하여 송사의 중요 작가를 고루 선정하고 대표작을 수록했다. 그러나 송사의 대표적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기타 송대의 사단에서 활약한 작가들의 작품도 수록하여, 송사의 전반적인 풍격과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시(詩)는 장엄하나 사(詞)는 아름답다!
누구나 즐기는 만인의 노래
중국 시가 문학의 황금기를 수놓은 송사(宋詞)의 정수
"비단 자리와 자수 휘장 안에는 귀공자들과 미녀들이 있어,
귀공자는 고운 종이를 돌려가며 아름다운 사를 짓고,
미녀들은 섬섬옥수를 들어 거문고를 타며 노래하니,
맑고 아름다운 사는 미녀의 요염한 자태를 돋보이게 한다."
당시와 함께 중국 시가 문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송사를 모아 엮은 『송사삼백수(宋詞三百首)』가 문학과지성사 대산세계문학총서 102번째 권으로 출간되었다. 사는 악곡에 맞춰 지은 시가로, 노래의 가사 부분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송사는 위로는 사대부로부터 아래는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애호를 받으며 유행했다. 사는 시가로써의 문학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음악으로서의 실용성도 가지고 있어서, 사대부와 일반 서민의 연회 석상에서 불리었다. "북송에서 사가 유행할 때에는 우물 있는 곳이면 모두 유영(柳永)의 사를 노래했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사는 신분과 상관없이 예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으로 즐겨 불렀던 가요였다.
『송사삼백수』는 청대(淸代)의 사학자(詞學者) 주조모가 송대의 대표적인 사작가의 작품을 골라 모은 사선집이다. 서명을 ‘송사삼백수’라고 한 것은 주조모가 선정한 작품 수가 300수였기 때문이지만, 이보다 앞서 청 견륭(乾隆) 때에 손수(孫洙)가 편집한 『당시삼백수(唐詩三百首)』가 있었고, 『시경(詩經)』을 ‘시삼백(詩三百)’이라고 부르는 데서 연유한 명칭이기도 하다.
『송사삼백수』의 초간본은 1924년에 간행되었는데, 수록된 작품 수는 서명과 같은 300수이고, 부록으로 13수가 더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후에 주조모는 내용과 형식이 완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작품을 빼고 283수만을 선정하여 중편본(重編本)을 내었다.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30여년 동안 학생을 가르친 이동향 명예교수가 증편본에 실린 283수를 옮기고 주석 및 해석을 덧붙였다. 주조모는 『송사삼백수』를 편찬할 때, 예술적 형식과 사상 내용을 모두 중시하여 송사의 중요 작가를 고루 선정하고 대표작을 수록했다. 그러나 송사의 대표적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기타 송대의 사단에서 활약한 작가들의 작품도 수록하여, 송사의 전반적인 풍격과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詞)란 무엇인가
중국 문학사에서는 흔히 당대와 송대를 중국 시가 문학의 황금기라고 말하는데, 당대에는 시가 최고봉을 이루었고, 송대에는 사가 찬란한 꽃을 피웠다. 오늘날의 중국인들도 고전 시가 가운데서 당시(唐詩)와 송사(宋詞)를 가장 즐겨 읽고, 일상생활에서도 당시와 송사의 명구를 인용하기를 좋아한다. 당대(唐代)의 시를 가리켜 당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송대의 사(詞)를 송사라고 하는데, 송나라 때의 가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송사는 후세로 오면서 곡조는 실전되고 가사(歌詞)만이 전해오고 있다.
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당대(唐代)부터이다. 처음엔 민간에서 시작된 민간 가곡의 유행은 점차로 상층 문인에게 수용되어 문인들도 활발하게 가사를 창작하게 되었다. 만당(晩唐)?오대(五代)부터 사는 새로운 시가 문학으로 등장하여 송대에 번영기를 맞아 크게 유행했다. 원래 사는 노랫말이기 때문에, 음악에 정통한 문인이 음악성도 고려하여 사를 지으면 노래로 부르기에 적합해서 가기(歌妓)나 여러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크게 유행했다.
그러나 송대의 문인들이 모두 음악에 정통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음악에 정통하지 않은 문인들은 기존의 사조(詞調, 사의 곡조이며 동시에 형식)에 의거해서 기존의 곡조에 가사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사를 지었다. 음악을 모르는 문인들이 기존의 사조에 의거해서 사를 지으면서부터 사는 음악과 분리되고, 사를 노래로 부를 수 없게 되면서부터 사는 서정시의 한 형식으로 남게 되었다. 남송이 망한 후에도 문인들은 사를 하나의 새로운 시형(詩形)으로 여겨 사를 창작했으니, 마오쩌둥(毛澤東)도 20여 수의 사를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대체로 노랫소리가 여인의 아름다운 목청에서 나오니
사는 정(情)에 가까워야 한다”
사는 기본적으로 연악(燕樂)과 가기(歌妓)의 두 요소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는 사의 특성에 영향을 주었다. 사를 곡조에 맞추어 노래하려면, 곡조의 음률과 가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와 사의 내용적 차이점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았다. 원칙적으로 작가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느낌과 생각을 시 또는 사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녀의 애정과 이별, 인생에 대한 감개와 철리, 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 일상의 잡다한 생활 정서, 산수 자연을 대하고 느끼는 정취 등 삼라만상을 제재로 삼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시나 사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는 연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가사이다. 가기가 술자리에서 주흥을 돋우기 위해 사를 노래할 때, 심각한 주제나 신랄한 풍자가 담긴 사를 노래한다면, 가기의 고운 목소리나 노랫가락과는 조화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술자리의 분위기와도 어울리지 않아 어색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사는 초기부터 순수한 서정을 위주로 하면서, 사의 내용과 언어는 부드럽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전통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사는 변했고 남송 초기와 후기의 사에는 망국의 통한과 비애가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시기의 작가들은 태평성세를 노래하며 남녀의 애정을 읊거나 여유 있는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한적한 심정을 노래할 처지가 못 되었다. 망국의 한과 분노, 시대를 근심하는 애국심, 영락해서 표류하는 신세 등을 많이 노래했다.
이상의 특징에 따라 송사의 풍격을 완약(婉約)과 호방(豪放)의 두 가지 풍격으로 나눌 수 있다. 완약 풍격은 음유미(陰柔美)를 근간으로 하고, 호방 풍격은 양강미(陽剛美)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완약’은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완곡하고 함축적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완약 풍격의 사는 대체로 남녀의 염정을 위주로 노래했고, 짜임새는 정밀하고 음률이 잘 어울리고, 언어는 세련되고 정세하여,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아름답다. ‘호방’은 의기(意氣)가 장하고 호쾌하고, 자유분방하여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였다. 호방 풍격의 사는 작품의 제재가 다양하고, 규모와 시야가 광활하고 기상이 넓고 웅대하다. 시문의 구법과 표현법을 즐겨 사용하고, 음률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지만 송사의 풍격을 완약과 호방으로 나누는 방법은 간단명료하여 편리하기는 하나,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분류이다. 풍격은 작가의 개성, 작품의 내용과 형식, 음악적 요소, 시대와 사회 등 여러 복잡한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 때문에 송사에는 완약과 호방 이외에 다양한 풍격이 있을 수 있으니, 송대의 사단(詞壇)은 마치 색깔과 향기와 모양이 다른 온갖 꽃이 만발한 동산과 같다.
자유로운 만인의 노래 사(詞)
사의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특성은 감정이 풍부하고 진솔한 순수 서정 문학(抒情文學)이라는 것이다. 당?송의 문인들은 거의 모두가 사대부 계층에 속해 있어서, 전통적인 사상과 예법의 구속을 받았다. 따라서 그들은 문학상의 자아 표현에 있어서도 속박을 받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당?송의 문인들은 시문(詩文)은 사람을 교화시키고 세상과 정치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산문은 도(道)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서, 주로 정치적 견해, 철학적 이론, 학술사상 등을 서술했고, 시는 일반적으로 정치와 인생에 관련된 정감과 뜻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는 윤리 예법의 구속에서 벗어난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작가는 희로애락의 진정(眞情)을 사로 노래할 수 있었다.
사는 서정 문학 가운데서도 염정적(艶情的)인 제재를 자유롭게 다룬 향염문학(香艶文學)이다. ‘향염(香艶)’이란 말은 원래 꽃이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뜻인데, 여인을 제재로 해서 지은 시문의 염려한 풍격을 뜻하고, 더 나아가 색정적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송대의 문인들은 시문에서는 윤리적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사에서는 자유롭게 감정을 분출할 수 있어서 남녀의 염정과 애원(哀怨)을 제재로 한 염정사(艶情詞)를 많이 지었다. 염정사 이외에 계절에 따른 감상(感傷), 무상한 인생과 세월에 대한 개탄, 화초와 자연 경관의 완상, 나그네의 향수와 이별의 수심 등을 사로 노래하는 경우에도 염정의 색채가 배어 있다. 이 때문에 전인들은 “시는 장엄하나 사는 아름답다.” “사는 경박함을 싫어하지 않는다.” “사는 미녀와 같다”라고 하여 사가 지닌 염정적 특성을 말했다. 독자들은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았던 자유의 풍격이 돋보이는 송사의 세계를 친절한 주석, 해설과 함께 맛볼 수 있을 것이다. 

'http:··blog.daum.net·k2gim·' 카테고리의 다른 글
| Re:古詩十九首12(고시십구수12) - 無名氏(무명씨)東城高且長(동성고차장) (0) | 2011.09.05 |
|---|---|
| Re:古詩十九首6(고시십구수6) -涉江采芙蓉(섭강채부용) (0) | 2011.09.05 |
| 당시 그 빛나는 서정을 찾아서 .저 : 이병수 ㅣ 감수 : 장춘식, 욱현호 ㅣ 출판사 : 도서출판정일 (0) | 2011.09.05 |
| 시원스런 초원 '알프스' (0) | 2011.09.05 |
| 秋暮郊居書懷(추모교거서회) - 백거이(白居易) (0) | 2011.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