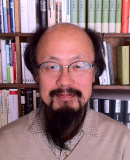| 시는 역사보다 진실하다? |
| “시는 역사보다 진실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시는 물론 고대 헬라스의 극을 말하겠지만 조금 넓혀서 생각한다면 유형, 무형의 모든 문학텍스트를 말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터이다. 아무튼, 역사는 기록된 사실(fact)을 다루는 과학이고 시는 인간 삶의 진실한(real) 측면을 형상화한 문학이다. 역사는
반드시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평가와 판단[褒貶]을 가하여 그 전모를 기술한 것이고 시는 누구에겐가 ‘일어났음직한’,
‘일어날 수도 있는’ 삶의 한 조각을 도려내어 빚어낸 것이다. 정사 『삼국지』의 주인공은 조조이지만 소설 『삼국지연의』의 주인공은
유비이다. 중국의 학자 노신(魯迅)의 『중국소설사략』에는 장터에서 이야기를 팔아먹고 사는 이야기꾼이 『삼국지연의』의 한 대목을 이야기하는데, 조조가 잘 되는 장면이 나오면 구경꾼들이 다 화를 내고 유비가 이기는 장면이 나오면 다 같이 손뼉을 치고 환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역사적 영향력이나 업적, 역사의 흐름과 발전방향, 역사적 의의, 역사적 성취와 같은 측면에서 유비는 조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민중은 유비의 실패를 안타까워하고 기꺼이 유비의 편을 들고자 했을까! 『삼국지연의』에 묘사된 유비는 인민의 생사를 자기의 생사로 여기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유비는 자기의 야심 때문에 인민을 배신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승자는 항상 거의 예외 없이 권력을 차지한 다음 권력을 전횡하고 농단하며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인민은 역사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시에서 진실을 찾았던 것이다. |
|
박계현(朴啓賢)이 경연 석상에서 성삼문(成三問)의 충성을 논하였다.
박계현이 “『육신전(六臣傳)』은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것인데 상께서 가져다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십니다.” 하고 아뢰었다. 이에
임금이 『육신전』을 가져다 보고는 놀라고 분하여 하교하였다. “말이 많이 그릇되고 망령되며 선조를 무함하여 욕하였으니 내가 다 찾아내어 모두
불에 태워야겠다. 또 그 『육신전』을 서로 이야기하는 자의 죄를 다스리겠다.” 다행히 영의정 홍섬(洪暹)이 입시하였다가 육신의 충성을 극력
말했는데 말이 매우 간절하여 시종하는 신하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아 상이 이에 감동하여 깨닫고 분을 그쳤다. |
 ▶ 세조에 의해 폐위된 소년 왕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실패하고 죽은 사육신의 묘. 한강 건너 노량진 언덕에 있다. 숙종 때 공식 인정을 받았다. 위키백과에서 인용. |
|
|
|
|
'http:··blog.daum.net·k2gim·'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삼국지 그림으로 만나다,서성 지음 ,천지인 | 2010.05.15 (0) | 2013.07.10 |
|---|---|
| 군주는 개인적인 의리를 잊어야 한다,글쓴이 : 권경열 (0) | 2013.07.10 |
| 보초 기러기의 딜레마 - 최연의 안노설(雁奴說)글쓴이 : 서정문 한국고전번역원 수석연구위원 (0) | 2013.07.10 |
| <唐詩 5만수 중 1천950수 뽑은 당시별재집 첫 완역>중문학자 서성 교수 6년간 작업 성과 (0) | 2013.07.09 |
| 聯律通則,中國楹聯學會 (0) | 2013.07.09 |